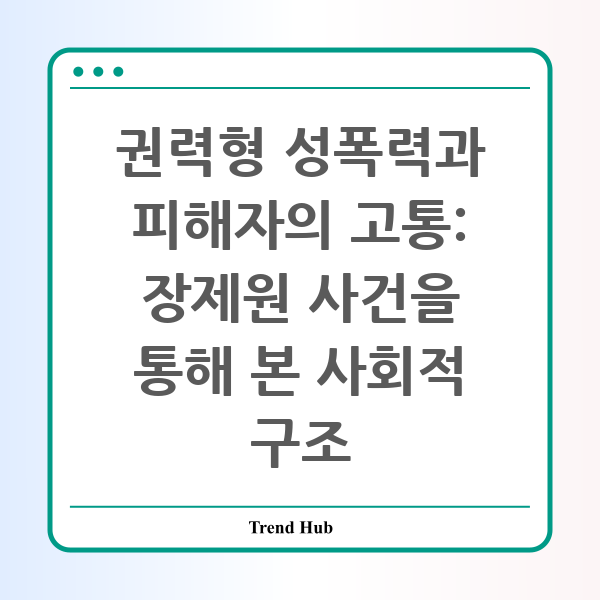
권력형 성폭력 사건이 다시 한번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 장제원 전 의원의 비서 성폭행 사건과 그의 자살은 피해자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겼다. 피해자는 고소를 결심하기까지 9년이라는 긴 시간을 견뎌야 했고, 마침내 용기를 내어 진실을 밝히려 했지만 피의자의 죽음으로 인해 다시 한 번 고통을 겪게 되었다.
이 사건은 단순히 한 개인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는 중요한 사례로, 피해자들이 겪는 심리적 고통과 사회적 낙인, 그리고 법적 권리의 박탈 문제를 동시에 이야기해야 한다.
장 전 의원이 성폭행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중 사망하면서, 피해자는 그동안 겪었던 고통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피해자는 사건 이후 정신적 고통으로 인해 치료와 상담을 받아왔고, 결국 법적 조치를 취하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피의자의 죽음은 피해자가 어렵게 찾은 법적 구제를 무산시킬 가능성이 크다.
심리상담사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감정이 복잡하다고 전한다. 가해자가 자살함으로써 위협에서 벗어났다고 느끼는 피해자도 있지만, 동시에 죄책감과 분노로 인해 트라우마가 심화되는 경우도 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도 비슷한 감정을 토로하며, 자신의 존재가 사라지는 것만이 남았다는 절망감을 표현했다.
사건의 수사가 중단될 가능성도 크다. 법적으로 피의자가 사망하면 수사는 종료되며, 공소권이 없다는 이유로 사건이 불송치되거나 불기소 처리된다. 이는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다. 피해자는 그간의 고통을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지만, 법적 절차의 중단은 그들의 회복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민변 여성인권위원회의 박수진 변호사는 피해자가 어렵게 선택한 피해 구제와 진실 규명 권리가 가해자의 죽음으로 인해 박탈되는 현실을 비판했다. 가해자가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한 선택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해자에게는 또 다른 고통으로 다가온다.
장 전 의원의 사건은 권력형 성폭력의 구조적 문제를 다시금 조명하게 된다. 권력이 있는 개인이 사망해도 그 권력을 만든 구조는 여전히 존재하며, 피해자에게는 여전히 위협을 가할 수 있다. 수사가 종결되면 범죄 사실을 명확히 밝히기 어려워지고, 피해자는 또 다른 2차 피해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피의자 사망 후의 무조건적인 수사 종결 관행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하며, 피해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자가 생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속해야 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
결국, 이러한 사건들은 단순히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피해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직시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야 한다. 힘든 과정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에게 법적, 사회적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